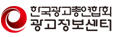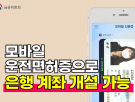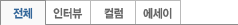글 정유라/ <말의 트렌드> 저자, 빅데이터 연구원
가장 빠르게 공감을 얻는 법
숏폼 콘텐츠가 대세다. 대세에 법칙이 있길 기대하는 심리를 반영해서일까. 흥한 숏폼 콘텐츠에도 공통점이 존재한다. <단시간에 몰입을 유도해 스킵을 피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임팩트를 남겨라>. 이 짧은 문장에도 몰입과 공감이 어려운데, 어떻게 '숏'폼에 녹여낼 수 있을까? 콘텐츠의 길이는 짧아졌는데 요구 사항과 검열은 늘어났다. 자극적이되 시대 감수성을 따를 것, 트렌디한 영상미를 보여주되 차별적 질감의 감성을 표현할 것. 외워야 할 공식도 문법도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 그건 비주얼의 감도도 콘텐츠의 오프닝도 아닌 '언어'다. 콘텐츠의 제목부터 재료까지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중요하다.
비주얼과 영상의 시대, 그중에서도 자극과 강렬함을 추구하는 숏폼의 시대에 언어의 중요성을 외치는 것은 역행이 아닌 역설의 강조다. 서사가 아닌 자극으로 소통하는 속도의 시대일수록 언어의 역할이 크다. 가장 빠르게 공감을 얻는 방법은 소통하려는 대상과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t와 f가 심하게 갈린다는 이 질문>이라는 숏폼의 썸네일엔 유명인도 자극적 장면도 없다. 이 콘텐츠의 핵심은 화려한 비주얼이 아닌 t와 f라는 단어의 함의다. t/f라는 용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mbti 성향으로 사고형 T, 감정형 F를 뜻함) 세대를 저격하는 언어 사용은 유효한 전략이다.
가장 빠르게 공감을 얻는 법
숏폼 콘텐츠가 대세다. 대세에 법칙이 있길 기대하는 심리를 반영해서일까. 흥한 숏폼 콘텐츠에도 공통점이 존재한다. <단시간에 몰입을 유도해 스킵을 피하고 공감을 바탕으로 임팩트를 남겨라>. 이 짧은 문장에도 몰입과 공감이 어려운데, 어떻게 '숏'폼에 녹여낼 수 있을까? 콘텐츠의 길이는 짧아졌는데 요구 사항과 검열은 늘어났다. 자극적이되 시대 감수성을 따를 것, 트렌디한 영상미를 보여주되 차별적 질감의 감성을 표현할 것. 외워야 할 공식도 문법도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 그건 비주얼의 감도도 콘텐츠의 오프닝도 아닌 '언어'다. 콘텐츠의 제목부터 재료까지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중요하다.
비주얼과 영상의 시대, 그중에서도 자극과 강렬함을 추구하는 숏폼의 시대에 언어의 중요성을 외치는 것은 역행이 아닌 역설의 강조다. 서사가 아닌 자극으로 소통하는 속도의 시대일수록 언어의 역할이 크다. 가장 빠르게 공감을 얻는 방법은 소통하려는 대상과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t와 f가 심하게 갈린다는 이 질문>이라는 숏폼의 썸네일엔 유명인도 자극적 장면도 없다. 이 콘텐츠의 핵심은 화려한 비주얼이 아닌 t와 f라는 단어의 함의다. t/f라는 용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mbti 성향으로 사고형 T, 감정형 F를 뜻함) 세대를 저격하는 언어 사용은 유효한 전략이다.
출처 @tiktok_kr
숏폼이 아닌 다른 폼의 전성기가 찾아와도 동시대의 공감을 기반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언어다. 흥행 법칙은 모르지만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언어의 트렌드를 읽고 사용하기 위한 방법은 있다. 새롭게 생겨나는 언어들의 문법을 이해하고 시대 정서와 동기화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줄임말과 접사의 공식
모국어 시험은 수능 언어영역 채점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나길 바랐다. 단어를 외우는 건 외국어 공부를 할 때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수능도 끝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는 것도 아닌데, 모르는 단어가 자꾸 생겨난다. 세대론이 뜨거운 시대답게 세대 검증을 핑계로 나의 모국어 능력을 시험하는데, 그 단어들이 종종 낯설다. 다행히 '어원을 알면 단어가 저절로 외워집니다'라는 영단어 책의 카피처럼 유행하는 신조어의 패턴을 익히면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쉽게 유추할 수 있고 훈련을 통해 한 단어에서 동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도 있다.
신조어의 가장 대표적인 문법은 줄임말과 접사다. 줄임말은 다소 억울한 누명과 사투 중이다. 별 걸 다 줄인다고, 국어를 파괴한다고, 소통을 저해한다지만 사실 모든 말을 다 줄이는 것도 아니고 모든 줄임말이 다 유행하지도 않는다. 비빔냉면은 '비냉'이 되지만 크림파스타는 '크파'가 되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은 크림파스타를 먹어야 하는 집단에서는 '크파'와 '토파(토마토파스타)' '오파(오일파스타)'가 친숙한 줄임말로 통용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모두의 공감을 얻진 못한다. 된찌와 크파 사이를 가르는 것은 '일상성'이다.
유행하는 줄임말은 그 말을 사용하는 집단과 세대의 일상성이 반영한다. 별 걸 다 줄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줄여 쓰는 말에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일상과 애정이 반영돼 있다. 스타벅스는 스벅이 되고, 올리브영은 올영이 되고, 배스킨라빈스가 배라가 되는 것처럼 특정 집단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줄임말로 된 애칭을 얻는다. 내게 중요하고 친숙한 것들을 줄여 부르고 싶은 마음과 습관은 시대와 세대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출처 @dblife_official
줄임말보다 더 선명하게 시대를 드러내는 신조어의 문법은 접사의 활용이다. 요즘 신조어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접두사와 접미사는 무엇인가? 어떤 접두사가 다양한 단어와 만나 세계를 확장하는가? 어떤 접미사가 새로운 상황과 만나 의미를 반복하는가?를 살펴보면 소소한 일상이 아닌 '가치관'이 보인다. '호캉스'라는 신조어는 새로운 여가문화이자 고급문화 향유의 예시로 빈번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여가생활이 다채로워졌음을 의미한다.
2017년에 국내 첫 공식 미쉐린 가이드가 출간되고 고급 미식문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도산공원을 중심으로 각종 스시야가 '오마카세' 서비스를 유행시켰고 이는 오마카세라는 용어의 대중화로 확산됐다. 이제 오마카세는 도산공원을 넘어 청계천 옆 을지로로, 망원동으로 확장해 이모카세와 티마카세로 변주된다. 미식문화의 또 다른 발전이다. 이처럼 활발하게 사용되는 접사는 문화의 스펙트럼과 가치간의 변화를 반영한다. 줄임말이 일상성의 함축이라면 접사는 문화현상과 가치관의 척도다.
동시대적 일상과 가치관을 반영한 신조어의 문법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언어가 나타나도 당황하지 않는다. 다만 알아볼 뿐이다. 이것이 만들어낼 시대의 운율을. 어떤 단어는 '금수저'나 '혼밥'처럼 논쟁적 담론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단어는 인스타용 광고에 몇 번 쓰이다가 사라질 수도 있다. 무엇이 오래갈지 알아보는 혜안은 무수히 피고 지는 신조어들을 이 시대의 일상성과 가치관의 렌저로 이해하고 해석할 때 생겨난다.
언어의 새로 고침
문법을 익혔다면 정서를 읽을 차례다. 오늘의 유행어가 내일의 구설수가 되는 사례가 꽤 많다. 인권위에서 아동 비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ㅇ린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출처 자체가 논란인 곳에서 만들어진 유행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세감에 젖어 사용하다 보면 더 큰 곤혹을 입곤 한다.
수시로 새로 고침 해야 할 것은 신조어의 목록이 아니라 새로워진 시대 감수성의 척도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교본처럼 익혀야 할 감수성의 교과서는 넷플릭스가 콘텐츠 및 조직 운영의 핵심전략으로 제시하는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으로 대표되는 세 가지 선언은 새로운 언어를 검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넷플릭스의 포용성 보고서 조사를 진행한 단체 Annenberg Inclusion Initiative가 발표한 자료 / 출처 @inclusionists
유행하는 신조어가 사회의 다양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형평성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는지, 누구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포용의 언어인지를 검열하고 자정하고 판단해야 한다. 만약 이 언어가 다양성을 폄훼하고 형평성을 저해한다면 쓰지 말아야 한다. 정당한 논리고 그 언어 사용 중시를 요청해야 하낟. ㅇㅇ충이라는 말에 담긴 혐오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ㅇ린이라는 단어에 담긴 차별적 시선을 이해하고 고쳐쓰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단어 불매 운동에 가담하는 것도 방법이다.
시대 감수성을 거스르지 않는 공평한 언어, 따듯한 언어, 글면서도 재치와 해학이 있는 명랑한 신조어의 흥행은 언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언어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책임이자 의무다.
시대 감수성을 거스르지 않는 공평한 언어, 따듯한 언어, 글면서도 재치와 해학이 있는 명랑한 신조어의 흥행은 언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에 언어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책임이자 의무다.